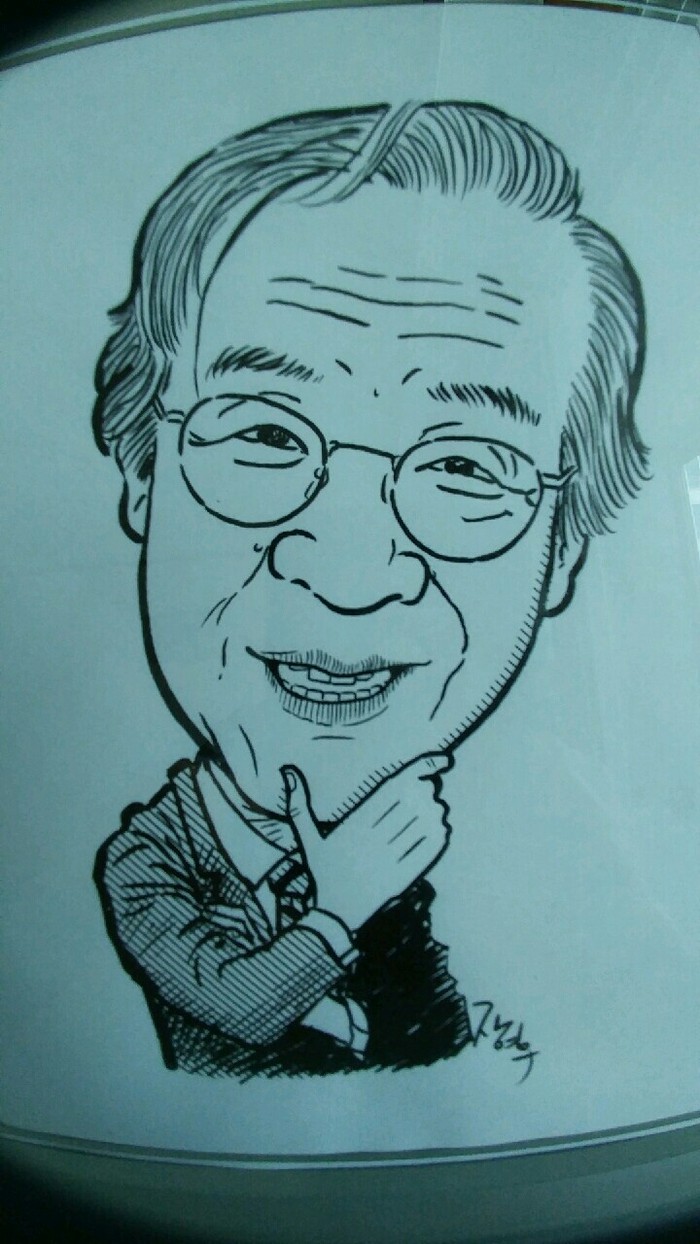 |
| ▲ 정영수 언론인. |
그날도 선술집은 초저녁부터 붐볐다. 동남아에서 취재 온 기자 몇 명이 ‘쫑파티’를 위해 따로 뭉쳤는데, 목에 건 프레스카드를 보고 먼저와 마시던 독일술꾼들이 아는 체를 한다. “기자시군요”. 그렇다고 하자 수고한다며 보드카를 한잔 씩 대접하겠단다. 고맙다고 건배를 제의하면서 “기자 좋아하느냐”고 태국기자가 묻자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기자를 존경하긴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We respect pressmen, but we don't like pressmen).
그날 그 독일인의 말이 비수처럼 다가왔다. 서독 본(Bonn)에 파견돼 취재를 마치고 분단독일의 현장인 베를린에 들린 것이다. 본은 당시 서부독일의 수도였고, 거기서 1985년 3월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Summit ‧ G7)이 열렸다. 베를린은 장벽(Wall)이 가로막혀 동서독이 엄연히 나뉘어 있던 때다. 서울에서 국제행사가 열리면 각국 대표들에게 판문점 등 남북 분단의 현장을 보여주듯, 분단독일도 베를린 장벽을 돌아보는 스케줄이 잡혀있었다.
서베를린 첫 밤, 통역 겸 우리 일행의 안내를 맡아온 서독 정부소속 가이드가 내방에 전화를 걸어와 잠시 로비에서 보잔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는 서독 정보기관 소속인 것 같았다.
“내일아침 일찍 동베를린 방문 스케줄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내게 던진 것은, 그가 한국의 국내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당시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공산국가를 방문할 수 없었다.
“찰리검문소에서 간단한 입국심사가 있거든요. 여권만 제시하면 되지요. 스탬프를 찍거나 보관하는 게 아니고 본인 여부 확인만 거친 뒤 돌려줍니다. 우리만 입 다물면 감쪽같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흥분과, 당시 한국의 실정법상 적성국의 밀입국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즉답을 피하자 그는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다음날 아침까지 잘 생각해보란다.
이게 무슨 비극이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분단을 겪지 않는 나라 기자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다음날 있을 동베를린방문에 꿈이 부풀어 있었다. ‘감쪽같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나도 동독 행을 과감히 택했다. 베를린 장벽을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찰리 검문소(Checkpoint Charlie) 앞에서 잠시 조마조마했다.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특별히 환영합니다(You’re especially welcome).”
연합군 장교로 보이는 중년의 여군이 패스포트를 확인하면서 묘한 인사말을 건넨다. 뜨끔했다. 왜 나를 특별히 환영한다는 것일까.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냥 수인사를 하고 건너가 동독 땅을 밟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체육부장관시절 88서울올림픽에 공산권국가 유치를 위해 얼마 전 이곳을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그쪽 버스가 와 있었다. 올라타자마자 안내를 맡은 동독할머니가 ‘위대한 레닌’ 어쩌고 하며 체제선전에 열을 올리더니 기념품판매에 들어갔다. 마르크스-레닌 기념배지(Badge)며 메달, 엽서 등 조잡한 물건들이었다. 하루를 긴장과 흥분 속에서 보낸 후 무사히 서독으로 귀환됐는데, 이 사실을 20년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정상회담이 열렸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베를린을 먼저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역사적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일단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깎아내렸다. 독일은 분단의 벽을 허문지 30년이 다돼가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