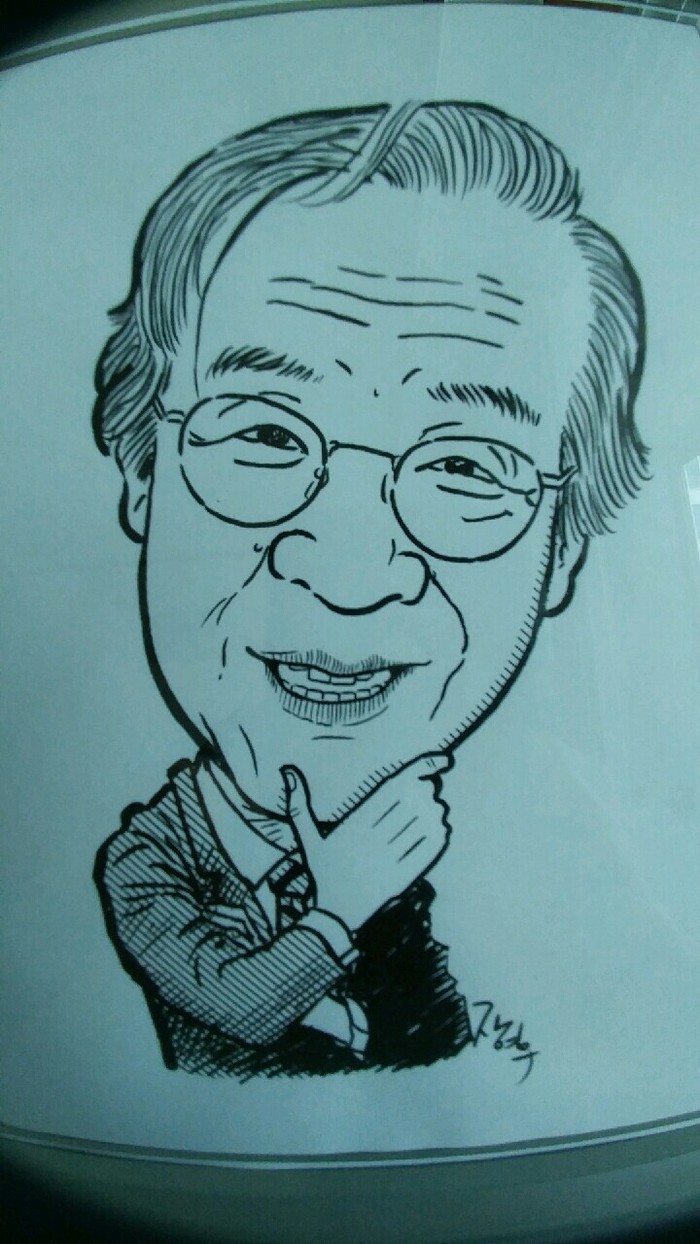 |
| ▲ 정영수 언론인. |
시골길, 고목 한 그루, 저녁, 등산모를 쓴 부랑자 A가 신발과 씨름하고 있다. 다 큰 어른이 신발을 벗으려고 끙끙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럽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는 희곡(戱曲) 전반에 걸쳐 이처럼 코믹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그때 지난밤 헤어진 동행자 B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도둑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의미 없는 대사가 되풀이된다.
A : 자, 이제 가자.
B : 안 돼.
A : 왜?
B : 고도를 기다려야지.
A : 아, 그렇군.
이 무료하고 무가치한 대화는 그 뒤에도 계속 반복됨으로써 그들이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도(Godot)란 신(神 · God)을 의미한다는 추정이 있긴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고도가 왔다고 생각하며 잠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무의미한 짧은 대사와 부조리한 행동이 연극의 시작이자 끝이며, 줄거리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을 블랙 유머로 표현하고 있다. 막(幕)이 바뀌어도 같은 무대이지만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 둘이서 3개의 모자를 재빠르게 쓰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는 놀이를 반복한다.
A :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럼 갈까?
B :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윽고 막이 내린다. 인간의 삶 자체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등장인물들이다. 여기서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과연 누구일까.
“이 광대한 혼돈 속에서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건 우리는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일세.”
극중 인물의 한마디가 드라마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다. 작가인 베케트 자신도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듯이, 이 희곡의 의미를 독자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내용이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민 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도록 한 것이 아닐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뮈엘 베케트(Samuel Becket)는 그의 희곡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노려봤을 것이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작가인 그가 불어와 영어로 쓴 이 작품을 통해 고도가 어서 와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길 바랐던 것일까. 그는 89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고도를 만났음인지 그도 따라 저 세상으로 가버린다. 그렇다면 고도는 혹시 ‘죽음’을 암시한 것일지도 모른다.
고도가 누구인지는 각자가 생각할 일이다. 빵이거나 자유일 수도 있다. 혹시 지난날 그 ‘촛불’은 아니었을까. 고도가 무엇이든 기다림은 언제나 인류를 존속시켜 온 힘이자 인간의 조건이다. 두 사람의 주인공은 고도를 기다리며, 결국 고도가 올 때까지 생사존망(生死存亡)을 알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우리도 고도라는 초인적인 존재의 초인적인 능력을 기다리는 ‘구세주 대망사상’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내 맡긴 두 등장인물의 ‘부조리극’은 결국 이 시대 우리는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고도는 바람처럼 우리 곁을 스쳐간 흔적이 있다. 고도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