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과 격변의 춘추 시대 다섯 영웅이 펼치는 대서사
 |
| ▲소설가 한완 |
계명대를 졸업하고 영천시 교육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한 소설가 한완이 지은 <춘추오패>다. 지식과 감성 간, 신국판 494쪽, 1만6000원.
우리가 흔히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의 대명사로 일컫는 춘추전국시대는 크고 작은 열국이 뒤엉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투쟁을 벌이던 시절이다. 수많은 제후국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의 역량을 키우고 전쟁을 일삼았던 춘추전국시대의 역사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시대였다. 각양각색의 인간 군상이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위해 갖은 권모술수와 하극상을 일삼았던 시절이다. 어쩌면 이후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특성이 춘추전국시대에 집대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사실 춘추의 무질서와 혼돈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통치자로부터 비롯됐다.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은 그가 역사서를 쓰게 된 취지를 이런 말로써 표현했다.
“지나간 사실을 기술함으로 장차 다가올 일을 안다(述往事知來者, 술왕사지래사).”
흘러간 역사가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믿음이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가능했을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시간의 모래 속에 묻히고 그 형체를 달리할지라도, 끝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바로 인간의 타고난 천성이다. 끝없이 추구하는 탐욕, 이기심, 정복욕, 투쟁심, 과시욕과 사명감, 이런 버릇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므로 역사와 정치는 시공을 초월해 꼭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은 과거도 아니다. 단지 그 등장인물이 바뀌었을 뿐,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어김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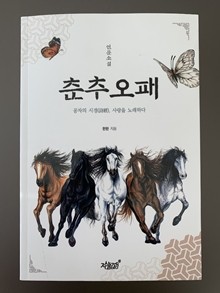 |
| ▲소설 <춘추오패> 표지 |
BC 770년, 중국 대륙에는 주(周)나라가 있었다. 이때 주유왕은 중국 4대 미인의 하나인 포사에게 빠져 있었다. 왕이 사랑한 포사는 이상하게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늘 차가웠고, 우울함이 감돌기까지 했다. 여기를 보고 있어도 먼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같은 여인들의 교태와 간드러진 웃음소리에 싫증을 느끼고 있었던 왕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보로 비상사태를 알리는 봉화가 올려졌다. 제후들은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달려왔다가, 오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왕좌왕 기가 막힌 모습이 되었다. 이를 본 포사는 처음으로 목젖이 보이도록 유쾌하게 웃었다. 왕은 그녀의 아름다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은 욕심에 마약처럼 자꾸만 봉화를 올렸다. 정작 견융(犬戎)의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려 제후들의 출병을 촉구하여도 군사는 하나도 오지 않았다. 연인을 웃게 만들려고 벌인 이벤트가 운명을 재촉한 것이다. 허겁지겁 달아나는 왕의 수레를 가로막은 것은 ‘선우’라고 불리는 흉노의 족장이었다.
“어라? 흐흐흐… 네년이 포사라는 계집이로구나.”
전쟁 중에도 새끼를 낳고 기를 젖통을 가진 짐승만은 해치지 않는 것이 초원의 법이다. 그러고 보면 모든 동물이 생명의 근간인 심장 바로 앞에 젖통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상징적인 일인가! 과연 유목하는 오랑캐답게 먼저 여자부터 챙겼다.
“무엄…, 하구나!”
새파랗게 질린 왕이 더듬거리면서 꾸짖자 다짜고짜 칼집을 세워 명치를 쑤셔 박았다. “헉….” 왕은 순간적으로 오줌을 지리면서 정신을 잃었다. 곧이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날 넓은 언월도가 왕의 목젖을 갈랐다. 물과 풀을 찾아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는 야만족에게 천자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는 없었다.
정착민의 생활과 문화를 영유하는 중원의 한족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람처럼 나타났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초원의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왜일까? 인구로 치자면 중원의 한 줌도 채 안 되는 흉노에게 그토록 오래 부대끼고 쥐여지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기동성의 문제라기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웃도 없는, 드넓은 초원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힘밖에 없다. 좋은 방목지와 여자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용사가 되어야 했기에 군사와 백성이 따로 없었다.
싸우는 게 일상이 되어 전쟁과 평시가 구별되지 않은 사회…! 비용도 없이 최고의 상비군을 보유하는 것이다. 중원의 국가들은 그들을 오랑캐로 불렀지만, 무시무시한 전투력만은 진저리를 치도록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사서(史書)는 특별히 서쪽의 오랑캐 서융을 개 견(犬) 자를 붙여 견융(犬戎)이라고 비하하여 위안으로 삼았다.
흉노가 막강한 것은 역사가 알고 있다. 훗날 서진(西進)하는 흉노의 등쌀에 못 이겨 세계사는 ‘게르만의 대이동’이라는 홍역을 치루었다. 로마가 망했고, 비잔틴이 뒤집히고, 중세 유럽 프랑크 왕국이 주도하는 체제의 토대가 되었다.
몇 달 후 전열을 정비한 중원의 군사가 몰려오자 견융은 일찌감치 달아났다. 오랑캐 족장 선우는 매달리는 포사의 가슴팍을 걷어차고 말에 올랐다. 전쟁이 휩쓸고 간 호경(鎬京, 현재의 서안 부근)은 무참히 파괴되었다. 견융이 또다시 공격해 올 우려도 지울 수 없었다. 유왕의 아들인 평왕(平王)은 수도부터 동쪽 낙읍(洛邑, 현재의 낙양)으로 옮기게 된다.
호경이 수도였던 때까지를 서주(西周)라 하고, 낙읍으로 동천(東遷)한 이후를 동주(東周)라 부른다. 동주는 이후에도 550년을 더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왕실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고 제후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천하가 무주공산이라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여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키기 시작했고, 세력을 키운 유력 제후는 천자의 명조차 듣지 않았다. 저마다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천하를 겨냥하는 지방화 시대, 곧 춘추전국시대가 전개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